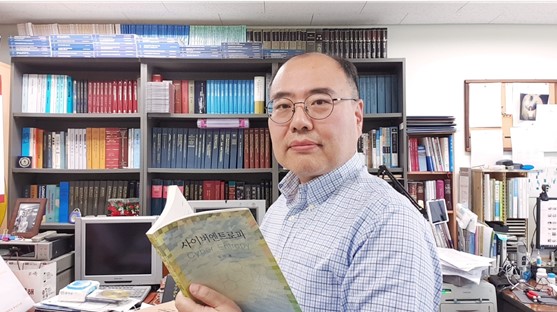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력독점 환상에서 깨어나야>
사법권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그것만을 외치는 순간 우리는 삼권분립의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국민을 놓치게 된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명제는 선언이 아니라 회로도다.
법원 역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맡아 행사하는 수임자일 뿐 성역이 될 수 없다. 사법권 독립이 주인과 대리의 관계를 전도시키는 방패가 되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형해화된다.
삼권분립의 목적은 기관 간 싸움을 붙이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의사가 권력의 시작과 끝이 되도록 권력을 서로 묶어두는 데 있다. 이 의미에서 분립은 절연이 아니라 연결이다. 입법ㆍ행정ㆍ사법을 분리하는 이유는 권력을 나눠 서로를 견제ㆍ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위임을 안전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서다.
국회가 행정을 묻고 대통령이 법률안에 제동을 걸며 법원이 위헌ㆍ위법을 가려 제동을 밟는 것, 그 어느 것도 ‘기관의 자율권’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대리권의 행사다. 사법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사법권 독립이 사법권에 대한 국민통제와 공적 설명책임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소비될 때다. 의회가 정쟁을 이유로 임명ㆍ예산을 무기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인사ㆍ행정ㆍ절차의 투명성 요구를 배척하거나, 정치적 파장을 핑계로 심사를 주저하는 것 역시 국민주권을 희미하게 만든다. 독립이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율이 아니라 자의가 되고, 그 틈에서 국민의 의사는 멀어진다. 국민없는 사법독립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회로의 단선이다.
그렇다고 국민주권이 즉흥적 직접민주주의의 구호로 환원될 수도 없다. 다수의 순간적 열기가 기본권을 압도하지 않도록 헌법은 절차와 견제를 설계했다. 선거의 주기, 공개토론을 전제로 한 예산ㆍ법률절차, 사법의 독립과 위헌심사, 언론ㆍ결사의 자유가 그 필터다.
중요한 점은 이 필터가 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민의를 법과 절차 속에 정제해 지속가능한 공권력으로 바꾸는 장치라는 사실이다. 사법권 독립 역시 이 설계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독립은 오로지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일 때 정당하다.
현대국가는 더 복잡하다. 위임입법과 규제기관, 중앙은행ㆍ선관위ㆍ감사ㆍ인권기구 같은 독립기관이 일상적이다. 사법부와 이들 기관의 독립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방패로서 소중하다.
그러나 방패가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예산ㆍ인사ㆍ정보공개ㆍ사법심사라는 국민통제의 사다리에 단단히 묶일 때만 그 독립은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다. 독립을 절대화하면 법원공화국 혹은 위원회공화국이 되고, 견제와 공개를 내장하면 설명 가능한 전문성이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이 전환의 핵심이다.
정치와 사법의 언어도 달라져야 한다. 국정감사와 사법행정의 보고는 서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설명책임을 이행하는 무대여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다수를 무시하는 방패가 아니라, 다수에게 재고를 요구하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듯 사법의 제동도 정치개입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헌정설계의 정상작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반대로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한 점검과 공개를 독립침해로 과잉방어할 때 독립은 공공성의 언어를 잃는다. 제동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실패를 막는 설계다. 이는 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은 분명하다. 민주공화국은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회도 행정부도 법원도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사법권 독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그 의사의 반영이다.
오늘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울타리가 아니라 더 투명한 다리, 더 강한 견제와 더 넓은 참여다. 사법권 독립만을 외치는 좁은 구호를 넘어 국민의 의사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권력을 서로 묶어두는 지혜를 회복할 때, 민주주의는 그 다리 위를 국민과 함께 느리지만 정확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